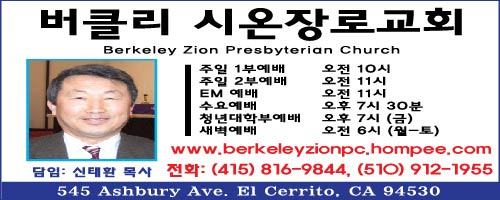유해도서 처리 놓고 주 별로 분화 양상... 책으로 쪼개진 미국

▲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해 6월 ‘금서 지정 금지법’에 서명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성오염(성혁명) 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동성애 찬반 논란에 이어 청소년 유해도서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주별로 분화하는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선 각 주별로 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에 있는 일부 도서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텍사스, 유타, 플로리다 등 10여개 주는 동성애나 노골적 성행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들을 도서관 등에 비치하면 벌금이나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금지도서로 지정한 셈이다.
해당 주들은 보수적 정파인 공화당 강세 지역들이다.
인접해 있는 다른 주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에선 동성애나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는 이유로 특정 도서를 금지도서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주들은 진보적 정파인 민주당 강세 지역들이다.
일부 도서들에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학부모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일부 논란이 되는 도서들이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학교,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들을 금서로 지정해 비치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금서 지정 요청을 받은 도서는 약 4300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진영에선 도서들에 제약을 가하는 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미국 사회에서 진보 보수 간 이념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전형적인 성오염 논란 사례로 여겨진다.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청소년 유해도서 논란은 지역적인 이슈를 넘어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라며 “여기에는 현재 미국이 당면한 성오염 위기가 내포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
| 11145 | 선스타 청소 재료상 - 교회/식당/사무실 빌딩/호텔/ 청소 재료상 (510) 252-1152 | 2024.03.27 |
| 11144 | "주행 한의원" (더블린/산호세) - (925) 828-7575 | 2024.03.27 |
| 11143 | KAPC 제 48차 정기총회 기금모금 골프대회 결산 | 2024.03.27 |
| 11142 | 전태일 부동산-기억장애를 겪는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 | 2024.03.27 |
| 11141 | 우니도 치과 (Unido Dental) | 2024.03.27 |
| 11140 | MIZU (Sushi Bar & Grill) | 2024.03.27 |
| 11139 | 빌립보교회-협동사역자 청빙 | 2024.03.27 |
| 11138 | 메디케어 보험 상담 408. 499. 7529 | 2024.03.27 |
| 11137 | 산호세 생명의 강 교회 / 대학교 | 2024.03.27 |
| 11136 | 털보 타이어 & 자동차 바디 - 타이어부터 바디까지 "원스탑서비스"! | 2024.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