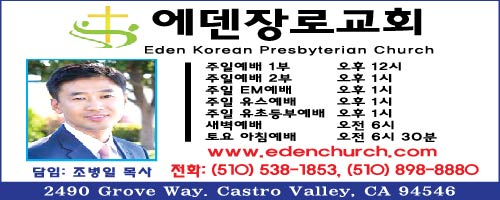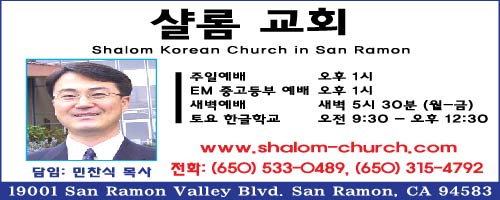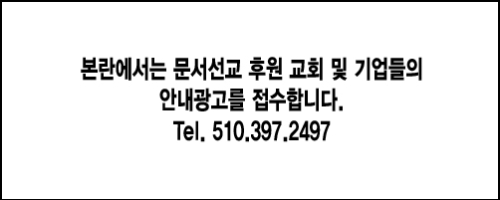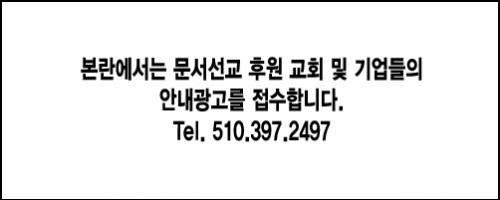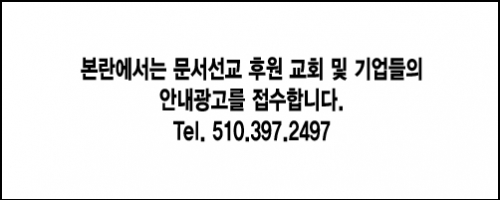<조명환 목사>
‘100세 장수 시대’라고 엄청 좋아 할 것 같지만 막상 그런 건 같지도 않다. 할 일 없이 오래 살아 뭘 하겠는가?
정부가 주는 웰페어 축내고, 젊은 사람들이 낑낑 힘겹게 낸 세금으로 아프면 꼬박꼬박 공짜 병원 신세나 지고 있을 바엔 그냥 일찍 죽는 일도 사실은 축복일수도 있다.
“너나 일찍 죽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나 또한 서운할지는 몰라도 지금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나라 살림 축내고, 의사들이나 병원들 배불리는 ‘의미 없는 100세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감이 간다는 말이다.
최근 양로원을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동안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세상은 온통 양로원 세상이란 착각이 들 정도로 골목마다 지천에 깔려 있는 게 양로원이란 생각이 들었다.
양로원의 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움직일 수가 없다. 휠체어가 있어야 한다.
끌고 다니는 사람도 필요하다.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는 노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게 다 돈이다.
그냥 누워서 숨 쉬고 있는 노인 인구는 앞으로 급속하게 증가될 것이고 이런 노인들 병수발하고 생명연장을 위해 미국이란 나라는 등 골 빠지게 벌어서 노인들의 생명 연장에 기여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 고통이 점점 더 크고 비대해 질 것이고 미국의 사회 복지 연금은 얼마 못 가 거덜 날 것이라고 한다.
양로원에 누워있는 많은 노인들은 사실 말할 힘은 없어도 대개 속으로는 “이렇게 누워있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요”라고 무언으로 외치고 있는 분들이 무지 많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오는 24일 개최되는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에 오른 프랑스 영화 ‘아무르(Amour)'를 보고 나는 죽음의 타이밍에 관해 자주 생각하곤 한다. 언제 죽는 게 감사한 일일까?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그 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살 때까지 살아보자고 다짐하면 문제는 간단해 진다.
그런데 뇌사상태로 식물인간이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눈앞에 있는 아내도 몰라보고 평생 키워 낸 아들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저어대는 치매환자라고 가정해 보자.
암에 걸려 통증을 참아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투병하는 암 환자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 환자를 옆에서 지켜주는 가족들의 고통을 상상해 보라.
가족들조차도 저럴 바엔 죽지 않고 왜 생명이 연장되고 있을까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런대로 잘 살아온 인생 같은데 느닷없이 천덕꾸러기로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고?
마침내 ‘제발 누가 날 좀 죽여 줄 수 없을까?’라고 하소연 하게 될지도 모른다.
고통 받는 육체, 의미 없는 육체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영혼을 육체로부터 떼어 놓는 행위를 우리는 단순히 살인이라고 말하고 그를 살인범이라고 정죄해야 할까?
‘아무르’란 ‘사랑’이란 말이라고 한다.
자식을 출가시키고, 단둘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음악가 출신의 노부부 조르주와 안느.
칠순을 넘은 나이에도 꼿꼿함을 잃지 않았던 안느는 오른쪽 마비로 예전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에 상실감을 감추지 못한다.
남편 조르주가 헌신을 다해 안느를 간호하고, 그녀의 꺾어지는 삶의 의지를 재확인시켜주지만 안느의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다.
입원을 원치 않는 아내를 위해 조르주는 그 역시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 몸이 편치 않은 아내의 온갖 수발을 다 들어준다.
어쩌다 한 번 예술가 특유의 고집을 부리는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끝까지 병든 아내의 곁을 지켜주는 조르주와 같은 남자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노인의 몸으로 오직 아내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아내의 곁을 지키던 조르주도 서서히 지쳐간다.
더 이상 자신의 의사조차 표현할 수 없는 안느도, 그녀를 무작정 바라봐야 하는 조르주도 힘들다.
그래서 조르주는 아내의 마지막 품위를 지켜주면서 둘 다 편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한다.
그래서 고통과 싸우는 아내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의 영혼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다.
우아하게 살아왔던 아내의 마지막 숭고함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리고 아내와의 동행(?)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012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영화다.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올라 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에 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 영화는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눈부신 삶의 순간은 잠깐이지만,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마저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란 이름의 위대함이 잔잔하게 그려진 노인영화.
질문은 이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죽음이란 극단을 선택한 조르주를 우리는 살인자라고 낙인을 찍어야 할까?
아내의 죽음이 외롭지 않게 하려고 더불어 죽음의 길을 선택한 그는 자살자인가?
아니 2중 범죄를 범한고로 하나님 나라 정문에서 퇴짜를 맞고 천국에서 쫓겨나는 실낙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
기독교가 안락사 문제와 함께 시방 진지하게 풀어내야 할 시급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크리스찬 위클리 발행인>
기획기사보기
| 188 | 다가오는 "National Day of Silence 2013"의 영향력과 거기에 대한 대책! ④ | 2013.04.03 |
| 187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 다시 설레이는 이름 '샌프란시스코' | 2013.03.27 |
| 186 | 다가오는 "National Day of Silence 2013"의 영향력과 거기에 대한 대책! ③ | 2013.03.27 |
| 185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 '그림 선교사' 미켈란젤로 | 2013.03.20 |
| 184 | 다가오는 "National Day of Silence 2013"의 영향력과 거기에 대한 대책! ② | 2013.03.20 |
| 183 | 디지털세대 크리스천의 삶과 사명- 세계화와 기독교 8 | 2013.03.20 |
| 182 | 조명환의 쓴 소리, 단소리 - 속삭여 주세요, 아멘 | 2013.03.13 |
| 181 | 아는게 힘이다!! 영적 가치관 전쟁 - 다가오는 "National Day of Silence 2013"의 영향력과 거기에 대한 대책!① | 2013.03.13 |
| 180 | 디지털세대 크리스천의 삶과 사명- 세계화와 기독교 7 | 2013.03.13 |
| 179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 사순절과 가시관의 수퍼스타 | 201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