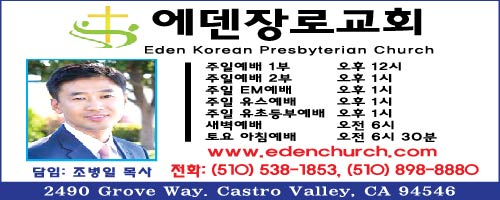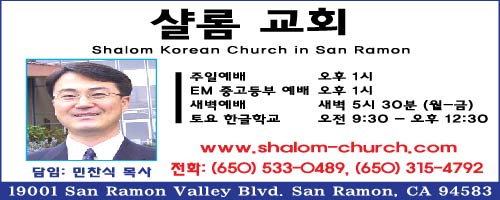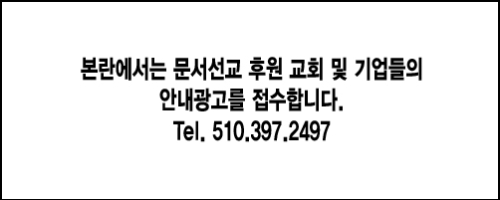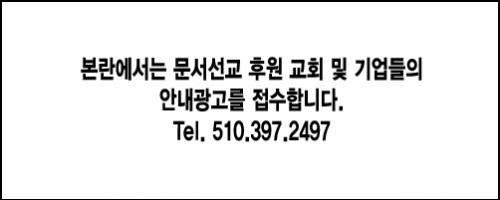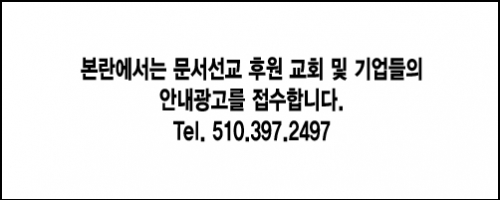탁영철 목사
세계화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세계화와 나쁜 세계화 그리고 중간적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가락양말을 수출하는 필맥스(Feelmax)는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으로 촘촘히 연결된 세계화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답 : 중립적이다)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양말을 싸고 다양하게 살 수 있게 된 소비자들에게 세계화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답 : 좋은 것이다)
국내에서 양말을 생산해서 국내에서 파는 기업에게 세계화는 좋은 것일까요, 반갑지 않은 것일까요? (답 : 반갑지 않은 것이다)
세계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환영받거나 배척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그 것을 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이라 할 만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세계화의 덫](한스 피터 마르틴, 영림카디널, 2003)을 읽으면 ‘세계화된 세계’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세계는 평평하다](토머스 프리드먼, 창해, 2006)는 세계화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세계화’를 다르게 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프리드먼은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자이고, 마르틴과 슈만은 미국의 독주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독일인 교수라는 무시 못 할 국가적 그리고 직업적 요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세계화의 덫]에 대하여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화에 관한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그 개념이라는 것은 참으로 애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세계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라는 의미가 구체적인 현실로 몸에 와 닿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에 의하면 세계화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인 경제통합은 굉장한 기회라고 떠들지만 결국 현실은 다릅니다.
증가하는 세계적 노동분업은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부의 분배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결여된 세계적 시장제도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시장에서의 낙오자 수가 계속해서 승리자의 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각 개인에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맹목적 효율성 경쟁과 임금 인하를 기초로 진행되는 범지구적 경쟁 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불합리성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제3세계의 일부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산층으로 통해오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잃고 불쌍한 하류층으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려움의 급격한 확산 때문에 매우 큰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가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획기사보기
| 1129 | 아는게 힘이다!! 알고 삽시다 - 미국, 이렇게 가다간 이슬람 국가가 되는것은 시간문제!? ① | 2012.11.07 |
| 1128 | 초대칼럼 - 디지털세대크리스천의 삶과 사명 | 2012.09.26 |
| 1127 | 조명환의 쓴 소리, 단소리 - 기후 변화와 '그린 크리스천' | 2012.09.19 |
| 1126 | 초대칼럼 - 디지털세대크리스천의 삶과 사명(3) | 2012.03.21 |
| 1125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75세 이상은 정신감정 받으라고? | 2023.03.15 |
| 1124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성지순례 유혹하는 사우디 아라비아 | 2022.08.17 |
| 1123 |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강아지 품에 안고 예배드리는 초신자 있는데... | 2019.10.02 |
| 1122 |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범죄자가 낸 헌금을 피해자들이 돌려달라는데.." | 2019.04.10 |
| 1121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말만 바꾼다고 일제 청산인가?" | 2019.02.20 |
| 1120 |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설교단이 있는 강단 활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9.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