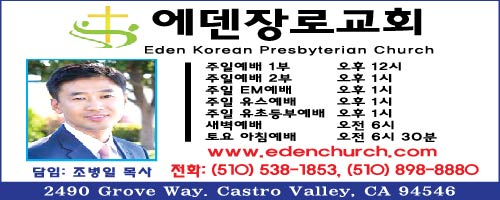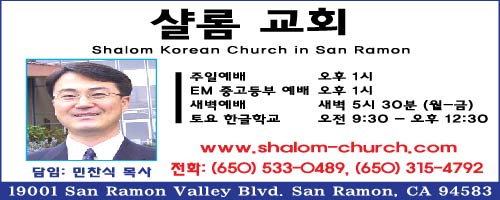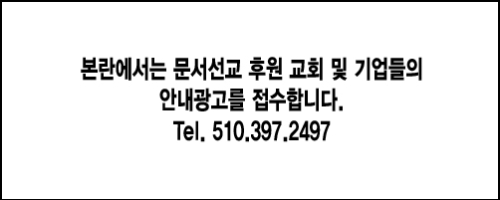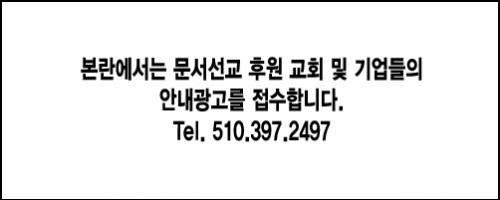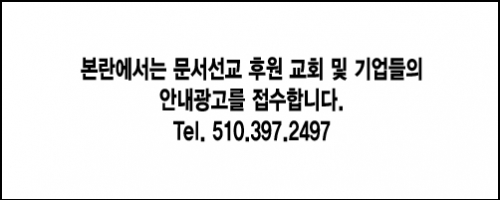탁영철 목사
<제자들교회>
“사회는 수백 개의 하위문화(subculture)와 디자이너 문화로 쪼개지고 있으며 그 각각은 고유의 언어와 코드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지닌다.”
필립 엘머-드윗(Phillip Elmer-Dewitt)이라는 저널리스트의 오늘날 사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회적 변화, 디지털문화를 중심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이념으로 인해 단일국가중심의 문화가 무너지고 각 개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위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전의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는 대체로 혈연과 지연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가족과 친인척이 많았고 대부분은 그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집에 살며 심지어 부부간이라도 자신들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다른 교회를 다니며 부모와 자녀가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더욱이 거주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분위기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자신의 뜻과 생각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부족문화(neo-tribalism culture) 시대에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는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대중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여 흐름을 읽지 못하면 존재 자체도 어려울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합집산(meeting and parting, 離合集散)의 토대가 다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신분과 계층에 근거한 이합집산이었습니다.
즉 양반과 평민 그리고 노비계층이 어울릴 수 없는 사회구조였기 때문에 어떤 신분을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차별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력에 근거한 끼리 문화가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부촌에 위치해 있는 교회와 빈민촌에 자리 잡은 교회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후반이후부터 서서히 변화가 이뤄지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호와 성향 그리고 이익에 근거하여 교회구성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는 어렸을 적부터 컴퓨터 문화 속에서 자란 디지털 원주민 세대(혹은 청년층이 되어서 컴퓨터 문화를 접한 디지털 이주민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사이의 격차가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요즈음 세대는 학교에 스마트 폰만 들고 가서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칠판에 판서한 것이나 파워 포인트를 찍어오고 필기가 필요하면 역시 스마트 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아무 것도 안 하거나 친구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줄 알고 혼을 내서 학생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 더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고 예배시간에 스마트 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노트하는 모습에 장년층이 흥분해서 지적을 하고 청년들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교역자들도 성경책이 없이 교회에 와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모습에 빈번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보기
| 168 | 디지털세대 크리스천의 삶과 사명- 세계화와 기독교 3 | 2013.02.06 |
| 167 | 아는게 힘이다! 영적 가치관 전쟁 - 논쟁 많은 오바마 케어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상)-① | 2013.01.30 |
| 166 | 디지털세대 크리스천의 삶과 사명- 세계화와 기독교2 | 2013.01.30 |
| 165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 조디 포스터의 커밍아웃 | 2013.01.23 |
| 164 | 아는게 힘이다! 영적 가치관 전쟁 -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공공연이 핍박을 받는 기독교 기업들과 학교들! ② | 2013.01.23 |
| 163 | 디지털세대 크리스천의 삶과 사명- 세계화와 기독교1 | 2013.01.23 |
| 162 | 아는게 힘이다! 영적 가치관 전쟁 -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공공연이 핍박을 받는 기독교 기업들과 학교들! ① | 2013.01.16 |
| 161 | 디지털세대크리스천의 삶과 사명 -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13 | 2013.01.16 |
| 160 |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 새해엔 "3초만 참아요" | 2013.01.16 |
| 159 | 조명환의 쓴 소리, 단소리 - 이기주의 밀어내고 눈부신 이타주의 실천하는 새해 | 2013.01.09 |